반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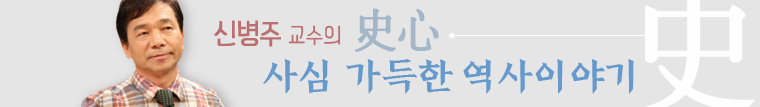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인 명동은 낭만과 품격을 갖춘 공간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신병주 교수의 사심(史心) 가득한 역사 이야기 (92) 명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타임스퀘어, 도쿄의 긴자(銀座) 등 세계적인 도시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다. 명동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조선 시대에는 명례동(明禮洞) 또는 명례방(明禮坊)이라 불렸고, 북촌과 대비하여 남촌으로도 불렀다. 일제강점 시기에는 명치정(明治町, 메이지초)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했고, 해방 후 현재까지 명동은 낭만과 품격을 갖춘 공간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명례동(明禮洞) 또는 명례방(明禮坊)이라 불렸고, 북촌과 대비하여 남촌으로도 불렀다. 일제강점 시기에는 명치정(明治町, 메이지초)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했고, 해방 후 현재까지 명동은 낭만과 품격을 갖춘 공간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남촌
조선후기 까지 서울은 5부(部) 47방(坊) 288계(契), 775동(洞) 체제로 운영됐다. 5부는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북부였으며, 방은 지금의 구(區) 개념과 비슷하다. 현재의 명동 지역은 남부 명례방(明禮坊), 호현방(好賢坊:회현동 일대), 훈도방(薰陶防) 등을 포함한다.
남산을 등지고 거주지가 형성됐던 만큼, 조선시대 명동은 주거지로는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었다. 권세 있는 양반들은 주로 북촌에 거주했고, 몰락한 양반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 남산 묵적동(墨積洞:현재의 필동)에 거주한 것으로 서술돼 있는데, 남산 지역은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모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다.
남산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충무로역 1번 출구 알에는 ‘류성룡 집터’라는 표지석을 볼 수 있다. 안동의 전형적인 양반마을 하회마을에 거주했던 류성룡(柳成龍:1542~1606)도 서울의 북촌에 진입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李舜臣:1545~1598) 장군 역시 명동과 가까운 건천동(乾川洞:마른내동)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류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살면서, 장군의 능력을 파악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남산을 등지고 거주지가 형성됐던 만큼, 조선시대 명동은 주거지로는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었다. 권세 있는 양반들은 주로 북촌에 거주했고, 몰락한 양반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 남산 묵적동(墨積洞:현재의 필동)에 거주한 것으로 서술돼 있는데, 남산 지역은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모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다.
남산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충무로역 1번 출구 알에는 ‘류성룡 집터’라는 표지석을 볼 수 있다. 안동의 전형적인 양반마을 하회마을에 거주했던 류성룡(柳成龍:1542~1606)도 서울의 북촌에 진입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李舜臣:1545~1598) 장군 역시 명동과 가까운 건천동(乾川洞:마른내동)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류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살면서, 장군의 능력을 파악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순신 장군 역시 명동과 가까운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조선후기 정치인이자 학자로, 국어책에 자주 나오는 <오우가>, <어부사시사>의 저자 윤선도(尹善道:1587~1671)가 살았던 곳도 명동이었다. 한성부 동부 연화방:종로구 연지동)에서 태어나,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그의 탄생을 알리는 표지석을 볼 수 있다. 윤선도는 8세 때 명례방 종현에 살았던 숙부의 양자가 된 이후로는 명동에 거처해, 지금도 명동성당 바로 맞은 편에는 ‘윤선도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다.
1997년까지 극동빌딩이 있었던 자리, 현재에는 남산스퀘어 빌딩이 들어선 곳에는 출판 담당 기관인 교서관(校書館)과 활자를 만드는 기관인 주자소(鑄字所)가 있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남부 훈도방에 속했고, 주자소가 있어서 주자동(鑄字洞)으로 불렸다. 남산 기슭 현재의 충무로 일대는 이현(泥峴), 즉 진고개로 불렸다. 이곳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비가 내린 후면 땅이 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산의 선비를 ‘딸깍발이’라고 부른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땅이 진 곳인 만큼 나막신이 필요했고, 나막신은 땅이 진 경우에는 요긴했지만, 땅이 마른 후에 걸어가면 나무로 만든 나막신 굽에서 딸깍 딸깍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1956년에 발표한 국어학자 이희승의 『벙어리 냉가슴』에 실린 수필 ‘딸깍발이’에는 ‘딸깍발이’로 불리던 남산골 선비들의 생활과 지조, 의기를 이어받자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후기 명동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이회영(李會英:1867~1932)이 있다. 이회영은 1867년 한성부 남부 명례방의 저동(苧洞)에서 태어났는데, 저동은 현재의 명동성당과 을지로 3가 주변이다. 명동성당 앞 YWCA 건물 앞에서는 ‘이회영 선생 집터’ 표지석을 만날 수가 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이회영 6형제는 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가족, 해방시킨 노비까지 약 60명이 압록강을 넘어 간도 지역으로 이주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97년까지 극동빌딩이 있었던 자리, 현재에는 남산스퀘어 빌딩이 들어선 곳에는 출판 담당 기관인 교서관(校書館)과 활자를 만드는 기관인 주자소(鑄字所)가 있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남부 훈도방에 속했고, 주자소가 있어서 주자동(鑄字洞)으로 불렸다. 남산 기슭 현재의 충무로 일대는 이현(泥峴), 즉 진고개로 불렸다. 이곳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비가 내린 후면 땅이 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산의 선비를 ‘딸깍발이’라고 부른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땅이 진 곳인 만큼 나막신이 필요했고, 나막신은 땅이 진 경우에는 요긴했지만, 땅이 마른 후에 걸어가면 나무로 만든 나막신 굽에서 딸깍 딸깍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1956년에 발표한 국어학자 이희승의 『벙어리 냉가슴』에 실린 수필 ‘딸깍발이’에는 ‘딸깍발이’로 불리던 남산골 선비들의 생활과 지조, 의기를 이어받자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후기 명동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이회영(李會英:1867~1932)이 있다. 이회영은 1867년 한성부 남부 명례방의 저동(苧洞)에서 태어났는데, 저동은 현재의 명동성당과 을지로 3가 주변이다. 명동성당 앞 YWCA 건물 앞에서는 ‘이회영 선생 집터’ 표지석을 만날 수가 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이회영 6형제는 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고, 가족, 해방시킨 노비까지 약 60명이 압록강을 넘어 간도 지역으로 이주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명동성당 앞 YWCA 건물 앞에서는 ‘이회영 선생 집터’ 표지석을 만날 수가 있다.
조선후기의 우국지사 황현(黃炫:1855~1910)이 쓴 『매천야록』에는 “일본 공사 미야모토 슈이치(宮本守一)가 전 판서 김상현이 머물렀던 녹천정(綠泉亭)을 빼앗아 그들의 공관(통감 관저)으로 만드니, 이때부터 차츰 차지해 주동(注洞), 나동(羅洞), 호위동(扈衛洞), 남산동(南山洞), 난동(蘭洞), 장흥방(長興坊)에서 서쪽으로는 종현(鍾峴), 저동(苧洞), 진고개 일대까지 뻗쳤다. 이로써 남촌의 북쪽 4/5를 아울러 40여 리가 모두 왜놈 마을이 되었다.”고 기록해, 일제강점 시기 이전부터 명동이 일본인들의 땅이 된 상황을 한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일제강점 시기의 명동
일제강점 시기에는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 일본인 거주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이 시기에는 무쓰히토(睦仁) 덴노의 연호를 따서 ‘메이지초(明治町)’이라고 불렀다. 명동 일대는 상업지구로 변모했고, 근대의 상징과도 같은 백화점들이 다수 들어섰다.

좌측 상단은 조지야 백화점(현재 롯데영플라자), 우측 하단은 미쓰코시 백화점(현재 신세계백화점).
1929년에 경성부 청사가 있던 진고개 입구(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미쓰코시(三越) 백화점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대식 건물로 탄생한 것이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건너 진고개 쪽으로는 히라타(平田)와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이 세워졌다. 히라타는 1906년 조선에 진출해, 1926년 주식회사로 변경했는데, 본정 입구(현재의 명동)라는 좋은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미나카이는 1929년 5층 건물의 신축을 시작해 1933년 그 완성을 봤다.
조지야(丁字屋) 백화점은 1929년 3층 건물을 새로 세웠고, 1939년 지하 1층, 지상 5층의 신관을 신축했는데, 당시 경성의 백화점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보유했다. 해방 후에는 ‘미도파 백화점’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롯데영플라자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의 상징 백화점이 명동 일대에 들어서면서, 명동은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조지야(丁字屋) 백화점은 1929년 3층 건물을 새로 세웠고, 1939년 지하 1층, 지상 5층의 신관을 신축했는데, 당시 경성의 백화점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보유했다. 해방 후에는 ‘미도파 백화점’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롯데영플라자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의 상징 백화점이 명동 일대에 들어서면서, 명동은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1939년 당시 경성의 백화점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보유했던 조지야 백화점은 해방 후에는 미도파 백화점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롯데영플라자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 시기 명동에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공공 기관은 조선은행과 중앙우체국이다. 조선은행은 1909년(융희 3) 10월 대한제국 시기 통감부가 설치한 한국은행이 1911년 8월 조선은행법에 따라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1912년 1월 다쓰노 긴코(辰野金吾)가 설계한 고전적인 석조물의 르네상스식 3층 건물은 현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앙우체국의 시작은 1884년 10월 17일 우정총국(郵政總局) 건물을 현재의 종로구 견지도(조계사 옆)에 세운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정총국이 개국하는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김옥균 등 개화파와 거사를 일으켰던 우정총국 책임자 홍영식(洪英植)은 정변으로 당일에 희생됐다. 우정총국이 처음 있었던 자리에는 1972년 체신기념관을 세워, 역대 발행 우표, 체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1905년 7월 1일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으로 명칭을 바꿔 명동으로 이전한 이래 계속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1939년 10월 1일에는 경성중앙우편국(京城中央郵便局)으로, 1949년 8월 13일에는 현재의 이름인 서울중앙우체국으로 바뀌었다. 건물 이름은 포스트타워(Post Tower) 또는 서울 우체국 타워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앙우체국의 시작은 1884년 10월 17일 우정총국(郵政總局) 건물을 현재의 종로구 견지도(조계사 옆)에 세운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정총국이 개국하는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김옥균 등 개화파와 거사를 일으켰던 우정총국 책임자 홍영식(洪英植)은 정변으로 당일에 희생됐다. 우정총국이 처음 있었던 자리에는 1972년 체신기념관을 세워, 역대 발행 우표, 체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1905년 7월 1일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으로 명칭을 바꿔 명동으로 이전한 이래 계속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1939년 10월 1일에는 경성중앙우편국(京城中央郵便局)으로, 1949년 8월 13일에는 현재의 이름인 서울중앙우체국으로 바뀌었다. 건물 이름은 포스트타워(Post Tower) 또는 서울 우체국 타워라고 불리기도 한다.

서울중앙우체국은 1905년 7월 1일 우정총국에서 경성우편국으로 명칭을 바꿔 명동으로 이전한 이래 계속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12년 11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청사 건물 앞에 홍영식의 동상을 세웠다. 정치적 입지를 떠나 초대 우정총판으로, 선진 문물 수용과 개화에 큰 공을 세운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반응형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
명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간 중의 하나는 명동성당이다. 명동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이자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명동성당의 정식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성당’ 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이고, 줄여서 ‘명동대성당’이나, ‘명동성당’으로 부른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 해인 1898년(광무 2년)에 고딕 양식으로 건립됐다. 이곳에 성당이 세워진 것은 조선 후기에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 ‘명례방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탄생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조선인 최초로 북경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이승훈(베드로)이 1784년 봄에 귀국해 김범우(金範禹:1751~1787) 토마스의 집에서 신앙모임 ‘명례방공동체’를 결성했다. 현재 명동성당이 자리를 잡은 곳은 모임 장소였던 김범우의 집이 있던 자리다.
김범우는 조선 후기의 역관 출신으로, 세례명은 ‘토마스’이다. 1785년 이벽, 이승훈, 정약용 등이 그의 집에 모여 예배를 보고 교리 공부를 하다가 발각된 명례방 사건으로 김범우는 단양으로 유배를 갔다가 사망했다.
김범우 사망 후 천주교 조선대목구가 주도해 명례방 언덕의 김범우 집터를 사서 현재의 명동성당을 세웠다. 건축 당시 조정에서는 “명동성당의 언덕 아래에 왕실의 어진을 모시는 영희전(永禧殿)이 있어서 풍수상 곤란하다.”고 했고, 이로 인해 1892년에 시작한 공사가 지연돼 1898년에 완공을 봤다. 영희전은 1619년(광해군 11)에 설치했던 남별전(南別殿)의 명칭을, 숙종 때인 1690년(숙종 16)에 명칭을 고친 것이다.
남별전이 위치한 곳은 남부 훈도방으로, 현재의 명동성당 동쪽이었다. 1909년 12월 22일에는 독립운동가 이재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 미사에 참석하고 나오던 이완용을 칼로 3차례 찔러 암살을 시도했다. 명동성당 앞에는 ‘이재명 의사 의거 표지석’을 찾아볼 수가 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 해인 1898년(광무 2년)에 고딕 양식으로 건립됐다. 이곳에 성당이 세워진 것은 조선 후기에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 ‘명례방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탄생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조선인 최초로 북경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이승훈(베드로)이 1784년 봄에 귀국해 김범우(金範禹:1751~1787) 토마스의 집에서 신앙모임 ‘명례방공동체’를 결성했다. 현재 명동성당이 자리를 잡은 곳은 모임 장소였던 김범우의 집이 있던 자리다.
김범우는 조선 후기의 역관 출신으로, 세례명은 ‘토마스’이다. 1785년 이벽, 이승훈, 정약용 등이 그의 집에 모여 예배를 보고 교리 공부를 하다가 발각된 명례방 사건으로 김범우는 단양으로 유배를 갔다가 사망했다.
김범우 사망 후 천주교 조선대목구가 주도해 명례방 언덕의 김범우 집터를 사서 현재의 명동성당을 세웠다. 건축 당시 조정에서는 “명동성당의 언덕 아래에 왕실의 어진을 모시는 영희전(永禧殿)이 있어서 풍수상 곤란하다.”고 했고, 이로 인해 1892년에 시작한 공사가 지연돼 1898년에 완공을 봤다. 영희전은 1619년(광해군 11)에 설치했던 남별전(南別殿)의 명칭을, 숙종 때인 1690년(숙종 16)에 명칭을 고친 것이다.
남별전이 위치한 곳은 남부 훈도방으로, 현재의 명동성당 동쪽이었다. 1909년 12월 22일에는 독립운동가 이재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 미사에 참석하고 나오던 이완용을 칼로 3차례 찔러 암살을 시도했다. 명동성당 앞에는 ‘이재명 의사 의거 표지석’을 찾아볼 수가 있다.

명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간 중의 하나는 명동성당이다.
명동성당은 천주교 교리를 전파하고 예배하는 대표적인 성당이자, 고딕 양식의 외관은 근대 건축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이 대표적인 성당으로는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 대구 계산성당, 아산 공세리성당 등이 있다. 1970년대 이후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공간이 되기도 했다.
성당 뒤편에 계성(啟聖)초등학교, 오른쪽에 계성여자중학교와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있었으나, 계성여자중학교는 1987년에 폐교됐다. 계성초등학교는 2006년 서초구 신반포역 인근으로 이전했다. 계성여고는 2016년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 학교명도 계성고등학교가 됐다. 계성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건물은 서울대교구청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성당 뒤편에 계성(啟聖)초등학교, 오른쪽에 계성여자중학교와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있었으나, 계성여자중학교는 1987년에 폐교됐다. 계성초등학교는 2006년 서초구 신반포역 인근으로 이전했다. 계성여고는 2016년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 학교명도 계성고등학교가 됐다. 계성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건물은 서울대교구청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
반응형
'핫한 트렌드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혼밥은 그만! 함께 요리하고 밥 먹자…1인가구 요리 클래스 (1) | 2025.03.21 |
|---|---|
| 급할 때 아이 돌봐드려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0) | 2025.03.21 |
|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해주세요 (0) | 2025.03.20 |
| 나만의 반려화분 만드세요! 매주 토요일 남산에서 가드닝 체험 (0) | 2025.03.20 |
| 올해 문화생활은 여기서! 새로 생기는 서울시립 문화시설 4곳 (0) | 2025.03.20 |



